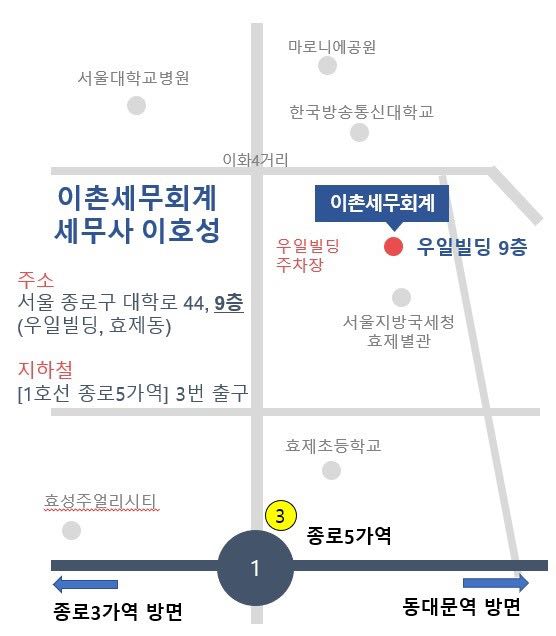목록인정이자 (6)
세금사례를 연구합니다.
 (법인세, 임원퇴직금) ‘옥중경영’에 대한 세법적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인세, 임원퇴직금) ‘옥중경영’에 대한 세법적 판단은 어땠을까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현실적인 퇴직’을 두고 다투었던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3개월 전인 올해 3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A회사와 B회사 모두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를 맡았던 C씨는 2016년에 A회사, 2017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각 사임하였고, A회사는 ○○억 원을, B회사는 ○억 원의 퇴직금을 C씨에게 각 지급했습니다. 이거 세법상 ‘임원퇴직금’이죠?과세관청이 2021년에 두 회사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C씨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금 상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관련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동시에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
 (증여세) 회사 스스로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처리했으니, 무조건 대표이사를 거쳐 간 돈이 맞습니다.
(증여세) 회사 스스로 ‘대표이사가지급금’으로 처리했으니, 무조건 대표이사를 거쳐 간 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 관련 증여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법인세에서 등장하는 ‘가지급금’이 증여세랑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작년인 2021년에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있었습니다. A씨는 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B회사로부터 2013~2015년에 받은 금원과 그의 배우자로부터 2015년에 받은 금원 등 합계 ○억 원을 A씨 본인의 차입금 상환, 국내외 부동산 취득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2020년에 과세관청은 A씨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후, 그의 배우자로부터 위 ○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A씨 앞으로 가산세를 더한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보냈어요.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은 증여세 과세가 이해되는데, B회사로부터 A..
 (최신, 종합소득세) 회사가 실제로 사용했으니, 그 부동산 취득자금은 나의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최신, 종합소득세) 회사가 실제로 사용했으니, 그 부동산 취득자금은 나의 ‘가지급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여부를 두고 다투었던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3개월 전인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04년에 B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년에 사임하였고, 사임 당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년에 그 공동대표이사도 사임했습니다. 2017년에 과세관청이 B회사에 대한 2012~2015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B회사에서 2014~2015사업연도에 파견직원 임금 횡령액과 2015년에 A씨와 B회사 간에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음에도 B회사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잔액, 2012~2015사업연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 합계 ○억 원이 사외 유출되어 A씨에게..
 (법인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일단 전부 회수했다가 새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법인세)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일단 전부 회수했다가 새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법인세 사례 1건을 같이 보시죠. 모든 세금사례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사례는 절대 함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요. 올해 3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A회사가 생산한 제품은 전량 B회사에 납품되고(※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B회사는 A회사 제품과 B회사가 자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A회사의 주주 4명이 B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러면 A회사와 B회사는 영락없이 서로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이 2017년에 A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3~2016사업연도 중에..
 (법인세, 가지급금) 그건 새로운 특수관계일 뿐, 일단 기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은 맞습니다.
(법인세, 가지급금) 그건 새로운 특수관계일 뿐, 일단 기존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 소멸여부가 쟁점이 된 법인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얼핏 보기에 꽤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자칫 헷갈리기 딱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1심법원과 제2심법원의 판단이 서로 엇갈리기도 했어요. 올해 1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A회사는 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2년과 2015년에 각각 법인 회생절차를 거쳤습니다. 과세관청은, A회사가 2009~2012사업연도 중 당시 대표이사였던 B씨에게 가지급금 합계 ○○억 원을 지급하고 인정이자를 계상한 후 이를 미수이자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A회사와 B씨 사이에 가지급금에 대한 약정이 없음을 이유로 위 미수이자를 익금불산입하는 한편, 인정이자 상..
 (종합소득세)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준 상태로 폐업하면, 그 돈은 ‘상여처분’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법인이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준 상태로 폐업하면, 그 돈은 ‘상여처분’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세금사례 연구가 이호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폐업법인의 상여처분 관련 종합소득세 사례 1건을 보려 해요. 작년인 2020년 9월에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어요. A회사는 2012년 8월에 설립되었다가 2014년 3월에 폐업하였습니다. B씨는 A회사 설립일부터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폐업하기 약 1개월 전에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어요. (실질관계는 잘 모르지만, 외관인 법인등기부등본 상으로 B씨는 폐업당시 A회사의 임원은 아니로군요) B씨는 2012년 당시 대부업체로부터 ○억 원을 차입하여 A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으로 납입했다가, A회사 설립 직후 그 납입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해당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 B씨 외에 2명의 주주가 더 있었다고 하네요)..